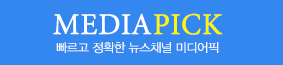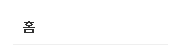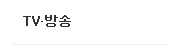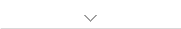숙의 거듭한 헌재…111일의 대장정, 이젠 '주문'만 남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를 가르는 날이 밝았다. 12·3 내란 사태로 국회가 윤 대통령을 탄핵 심판에 넘긴 후 헌법재판소는 숙의를 거듭해 111일 만에 결론을 내리게 됐다. 탄핵 심판은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지만, 재판관들은 11차례 변론 진행을 통해 주요 쟁점을 면밀히 다뤘다. 선고일이 예상보다 늦춰지자 갖가지 해석이 난무하기도 했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두 차례에 걸친 투표 끝에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상계엄 선포 11일만이다.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건을 접수한 당일 헌재는 '2024헌나8' 사건번호를 부여했다.
헌재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심판 시작부터 난항을 겪었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던 윤 대통령은 정작 탄핵심판이 시작되자 관련 서류를 받지 않는 등 심리 지연을 꾀했다. 헌재가 인편과 우편, 전자문서 등을 통해 관저와 대통령실에 서류를 보냈지만 대통령 측은 이를 받지 않았고, '꼼수' 논란이 제기됐다. 결국 헌재는 '발송송달' 방식을 적용해 서류가 정상 송달된 것으로 간주했다.
첫 변론준비기일은 헌재가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지 13일이 지난 작년 12월 27일 열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변론준비기일 당일 오전이 돼서야 기습적으로 대리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심리 시작 5시간 전에야 선임된 대리인단은 "늦게 선임된 점을 감안해달라"며 재판을 미뤄달라고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관 정족수 부족 문제도 초기부터 걸림돌이 됐다. 지난해 10월 퇴임한 이종석 소장과 김기영·이영진 재판관 후임이 대통령 탄핵안이 접수된 날까지도 채워지지 않으면서 헌재는 재판관 '6인 체제'에서 심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31일 정계선·조한창 재판관이 극적으로 임명되면서, 2차 변론준비기일부터 재판관 8명이 심리에 참여했다.
변론은 속도감 있게 진행됐다. 매주 두 차례 집중심리를 열어 총 11차례 변론기일이 이뤄졌다. 피청구인 출석 의무가 있는 1차 변론 때는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4분 만에 심리가 끝나기도 했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 구속되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소되는 등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와 기소, 형사재판이 별개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구속되고 이틀 후인 지난 1월 21일 3차 변론부터 심판정에 직접 출석했다.
증인신문은 4차 기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부터 6차례 진행됐다. '국회 봉쇄', '체포 지시' 등 그날의 진실이 16명의 증인의 입을 통해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심판정에 총 8차례 출석했다. 출석 때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윤 대통령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며 강변했다. 9차 변론 기일에는 헌재에 왔다가 서울구치소로 돌아갔다.
약 2달 간의 심리를 마친 헌재는 2월 25일 변론을 마무리 지었다. 당초 변론 종결 후 약 2주 뒤면 선고기일이 잡힐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예측은 빗나갔다. 헌재는 윤 대통령 사건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었다. 정형식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중요하다"며 신속 심리 방침을 밝힌 바 있어 헌재의 장고(長考) 배경을 두고 갖가지 해석이 이어졌다.
초반에는 재판관들이 '만장일치' 의견을 내기 위해 시간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다 3월 말이 되자, 재판관 간 견해차가 극심하다는 '갈등설'이 떠올랐다. 4월 초 선고가 가시화되자 헌재가 '5대3 교착상태' 빠졌다는 해석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결정 선고 없이 오는 18일 퇴임할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1일 선고일을 공지하며 논란을 일축했다. 재판관들은 막판까지 결정문의 세부 문구 등을 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제는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르는 '주문' 낭독만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