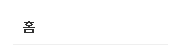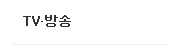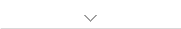최저임금 돌봄교사입니다, 딸기를 배부르게 먹고 싶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딸기를 먹을 기회가 있으면 먹지만, 일부러 사서 먹지는 않는다.
나에게 딸기는 아픈 과일이다. 엄마는 딸기 농사를 30년 넘게 지으시며 그 열매로 자식을 공부시켰다. 그러나, 엄마가 얻은 훈장은 굽은 허리와 마디가 굵어진 손가락 뿐이다. 딸기를 볼 때마다 엄마의 등과 손가락이 생각나고, 미안해서 못 먹겠다. 딸기 농사로 키운 딸을 엄마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데, 나 스스로는 부끄러운 비정규직이었다. 엄마는 나를 옆에 데리고 다니실 때면 자랑스럽게 말씀하신다.
"우리 딸은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네~ 좋으시겠어요."
나는 엄마가 생각하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아니다. 엄마가 저렇게 자랑하실 때마다 떳떳하게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었다. '정규 선생님 아니고, 돌봄 선생님이에요' 난 왜 당당하게 돌봄 선생님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걸까?
내가 돌봄 선생님이라고 소개했을 때 "아, 네?"라며, '겨우' 하는 눈빛을 여러 번 겪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굳이 묻고 따지지 않아도 내가 받는 임금을 능히 가늠하며 그런 눈빛을 보낸다. 돈으로 모든 걸 평가하는 시대에 우리는 그런 대우를 받는 문제투성이 시스템에 길들여 졌다. 지위가 인격이 아님에도 우리는 하는 일에 비해 쓰고 버리는 소모품처럼 헐값 취급을 받는 비정규직이다.
우리도 대한민국의 미래이자 보물 같은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지만, 최저임금만 받는 노동자인 거다. 차별을 가르치지 말아야 할 학교에서 제일 먼저 정규직과 비정규직 편을 갈라 차별한다. 최저임금을 받는 자를 무시해도 된다는 문구는 어디에도 없지만, 최저임금 받는 자들은 여기저기서 가뿐하게 무시 당한다.
일 년 내내 고생해도 관리자들은 교사들의 수고만 알아주고, 우린 관심 밖이다. 겨울 방학 내내 아이들을 돌보느라 추운 바람과 폭설을 뚫고 출근해도 맛있는 건 자기들만 먹는다. 학교에서 1년 내내 각종 연수가 행해지지만, 그림의 떡이다. 듣지도 않고 그냥 사인만 할 때가 부지기수다.
교직원 전체 모임에도 참여하기 힘들고, 교직원 동아리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참여할 수 없는 시간대에 운영할 때가 많아서다. 배려 받지 못하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며 두루뭉술 넘어간다. 우리는 뭐라 제대로 따지지도 못하고, 손해 보고 만다. 이게 최저임금을 받는 현실의 나다.
전체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