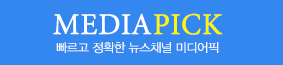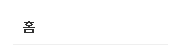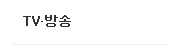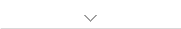재난 피해자 권리의 선진사례를 돌아보다
아무리 긴 세월이 흐르더라도
영국은 피해자와 시민의 힘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참사의 진실을 밝힌 경험이 있다. 한국에도 재난 조사의 선진사례로 소개된 힐즈버러 참사와 더비셔호 참사가 그것이다.
힐즈버러 참사는 1989년 4월 15일 영국 셰필드에 있는 힐즈버러 스타디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경찰과 스타디움 운영진이 인파 관리를 하지 못하고, 출입구 개방을 잘못 결정하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 800여 명이 다치고, 97명이 희생되었다. 당시 경찰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술에 취한 축구 팬, 일명 '훌리건'들이 사고를 유발했다고 허위로 보고했다. 언론도 이를 그대로 받아쓰면서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후 여러 번을 걸쳐 조사가 이어졌고, 경찰의 거짓말과 증거 조작 또한 밝혀졌다.
2016년 영국 법원은 최종적으로 힐스버러 참사가 경찰과 공공기관의 과실로 인한 불법적 사망이라고 판결했다. 더비셔호 참사는 1980년 9월 9일, 영국의 대형 벌크 화물선1) 더비셔호가 해상에서 태풍을 만나 침몰한 사고이다. 선원 42명과 선원의 가족 2명 등 총 44명이 목숨을 잃었다. 영국 정부는 공식 조사 없이 선박이 태풍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침몰했다고 주장하며 유가족 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진상규명 활동을 이어왔고, 1994년 국제운송노조연합의 지원으로 사고 해역에서 심해 탐사가 진행되었다. 심해 탐사에서 발견된 선박의 잔해로 인해 1997년, 유가족들의 추가 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49일간 심해 4000미터에 위치한 잔해 조사가 이뤄졌고, 이 조사에서 선박의 결함(화물창 덮개의 취약성)이 침몰의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영국의 재난 피해자들은 계속해서 진상조사 기회를 만들고 시도해 왔다. 그 과정에서 추가 조사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반응을 전혀 걱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힐스버러 참사나 더비셔호 참사의 경우 수십 년에 걸쳐 여러 번의 조사가 이뤄졌는데, 바탕에는 지역사회와 시민사회의 협조가 있었고, 어느 당이 집권했는지와 무관하게 정부가 나서서 조사를 진행했다. 프랑스의 재난 피해자 지원단체인 펜박(FENVAC)의 활동가들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단 하나의 의심이 남지 않게끔 진행하며, 누군가 숨긴다고 진실이 숨겨지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에 걸쳐 말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조사 자체가 난항이다.
믿을 수 없는 수사기구, 설립부터 어려운 조사기구
한국의 경우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우선되지만, 검경 수사에 대한 피해자들의 신뢰도는 높지 않다. 정권의 책임으로 연결될까 봐 정권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모습들을 여러 차례 봐왔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진행하는 국정조사의 경우, 여야 갈등으로 결과 보고서까지 채택되는 경우가 절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참사 국정조사는 증인 채택 단계에서 여당(당시 새누리당)의 비협조로 틀어져 청문회조차 진행되지 못했다.
독립적인 조사의 경우 주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조사기구를 만드는 형태로 이뤄지는데, 재난 참사에서는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사, 이태원참사(진행중) 세 참사에 대해서만 진행되었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시작부터 정부와 여당의 방해 논란이 있었으며 결국 강제 종료되었다. 이태원참사의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법안 공포를 거부하여 특별법이 통과되는 데에 1년 6개월이 소요되었다. 참고로 채 해병 특검법은 세 차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아직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 재난참사 외 사건에 대한 조사까지 넓히면, 특별법을 통해 조사한 사례는 5.18 민주화운동, 제주 4.3 사건 조사가 있었다.
재난참사 발생 이후 특별법을 만들어 조사기구를 만드는 것은 매우 어렵고 지난하다. 게다가 조사기구를 통한 한 번의 조사면 모든 것이 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지금 한국의 현주소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나 진실화해위원회처럼 재난참사 관련 독립적이고 상설적 조사기구가 꼭 필요하다.
전체 내용보기